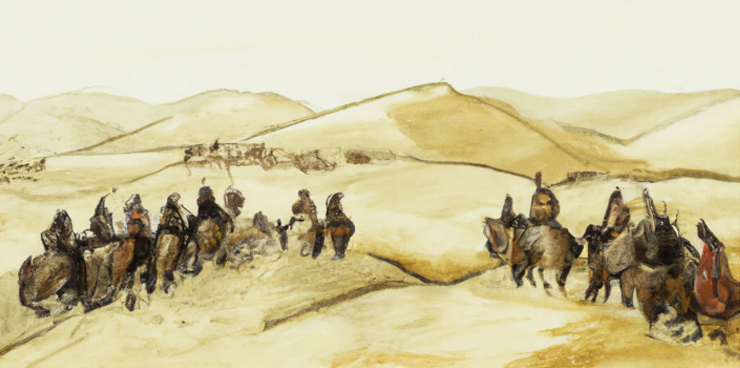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현재의 의식속으로 불러내어 현재 관점에서 다시금 간직하고 보존하는 행위” 즉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말하였다. “역사속으로” 글의 목적은 조선사 및 고려사에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던 사건들을 반추하고 대화함으로써 축적과 총량의 법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함이다.
쇠퇴하는 고려와 조선의 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위화도 회군”과 “선죽교의 피”등의 사건을 들 수 있다.
1. 위화도 회군
고려의 최영은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이 “철령 이북의 고려국 영토가 원나라 영토였다는 이유로 반환하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자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된다.
이에 이성계는 4불가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둘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왜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다.
넷째,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다.
위 이론은 정도전, 정몽주를 필두로 한 신진사대부의 요동 출정 반대에 대한 정치적 주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쟁 천재였던 이성계의 계획적인 명분에 불과하다.
최영은 요동정벌을 강행하게 되고 최영은 팔도 도통사, 조민수는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요동정벌군을 구성하게된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에 두려움이 컸던 우왕은 최고 사령관인 최영이 전쟁터가 아닌 우왕의 곁에서 머물며 지켜주기를 원했고 이성계에게 군사 4만을 맡기게 된다. 요동출정 중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 진주하게 되고 두 번의 회군을 청하였으나 거절되고 1388년 6월 26일 회군하게 된다. 돌연한 회군에 최영은 이성계군에 반격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조민수의 선발대 및 본대를 격파하였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성계, 조민수 군에게 체포되었다. 이성계는 조선 개국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우왕과 최영을 제거함으로 조선 개국의 문 앞에 서게 된다.
2. 선죽교의 피
위화도 회군을 찬성하였던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고자 구세력을 제거하였고 임금마저 갈아치우며 고려 안에서 개혁을 원하였다. 그러나 이성계와 사상적 결합을 하였던 정도전은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기를 원했다. 사냥중에 이성계의 낙마로 인하여 기회를 포착한 정몽주는 정적 숙청 작업을 진행중에 홀로 이성계 병문안을 가게된다. 돌아오는 선죽교에서 이방원 일당에게 철퇴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의 단심가>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성계는 최대 정적이었던 최영과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하게 되는데, 만약에 최영이 요동정벌에 나서 전쟁 천재였던 이성계를 선봉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명나라를 정벌했다면, 정몽주가 홀로 이성계 병문안을 가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의구심이 든다.

